
과거 ‘상실의 시대’를 출간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기가 치솟던 시절 미디어에서는 하루키의 칭찬 일색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으니 대학 초년생의 내 주변에서도 무라카미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야”, “나는 트렌드를 아는 사람이야” 하고 느끼는 것 같았다. 순전히 내 착각이겠지만.
‘상실의 시대’의 열기가 다소 식을 즈음 그때서야 처음 무라카미 소설을 집어 들었다. ‘상실의 시대’에서 청춘의 자유분방함과 주변 인물들의 잇단 죽음으로 주인공 와타나베가 괴로움을 겪는 내용 전개는 나에게 적지 않게 거부감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살’이라는 소재에서라기보다 어렸을 적부터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했던 나의 과거와 유사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웠던 나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우울했고 유약했으며 자기 부정, 현실 도피 등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반대 급부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무감에 괜히 오버액션하거나 큰 소리를 내어 웃기도 했다. 나의 겉과 속의 괴리가 상당히 컸다고 회상한다. 그런 감정들로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주체적인가 아니면 회피하는 것인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했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상실의 시대’가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지만 나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같은 판타지에 더 호감이 갔다. ‘일각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으로 접했던 것 같은데 설정이 무척 신선했고 한참 후에 개봉한 영화 ‘인셉션’의 하루키 버전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전에 읽었던 소설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주인공의 심리묘사와 서스펜스가 결합되어 흥미진진했고 결말도 마음에 들었다. 이미 이전 포스트에서 ‘안자이 미즈마루’씨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하루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소설의 주제와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가의 삶은 어떨까 하고 여러 권의 책을 빌렸지만 끝까지 본 유일한 책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이라는 에세이다. 수필은 오롯이 작가의 이야기를 닮고 있기 때문에 픽션을 다루는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작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다.
수필집을 집어든 계기는 사실 안자이씨가 삽화를 그렸기 때문이라는 점이 가장 컸다. 책 표지부터 단순하면서도 하루키씨의 얼굴을 그럴싸하게 묘사한 부분이 다소 웃음을 자아내게 했고 아마도 책 제목으로 선정한 수필의 내용이 작가 본인의 엉뚱한 면을 드러내는데 제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책 표지의 그림은 제목과 동일한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의 삽화인데 하루키씨가 쌍둥이와 연애하는 꿈에 대한 단상과 쌍둥이와 사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죄송하지만)어찌보면 ‘쓸데없는’ 이야기였다. 물론 현실성도 낮지만 그것을 의외로 진지하게 풀어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엉뚱한 생각을 사유하면서 글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 작가와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반면에 이런 상상을 독자가 모두 보는 책으로 출판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다. 아내의 추천으로 알게 된 작가 임경선 씨의 수필을 읽으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문구가 기억에 남았다. ‘수필은 자신을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이나 가식이 가미되는 순간 그 글을 읽는 독자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수필을 통해 새로운 작가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며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대단한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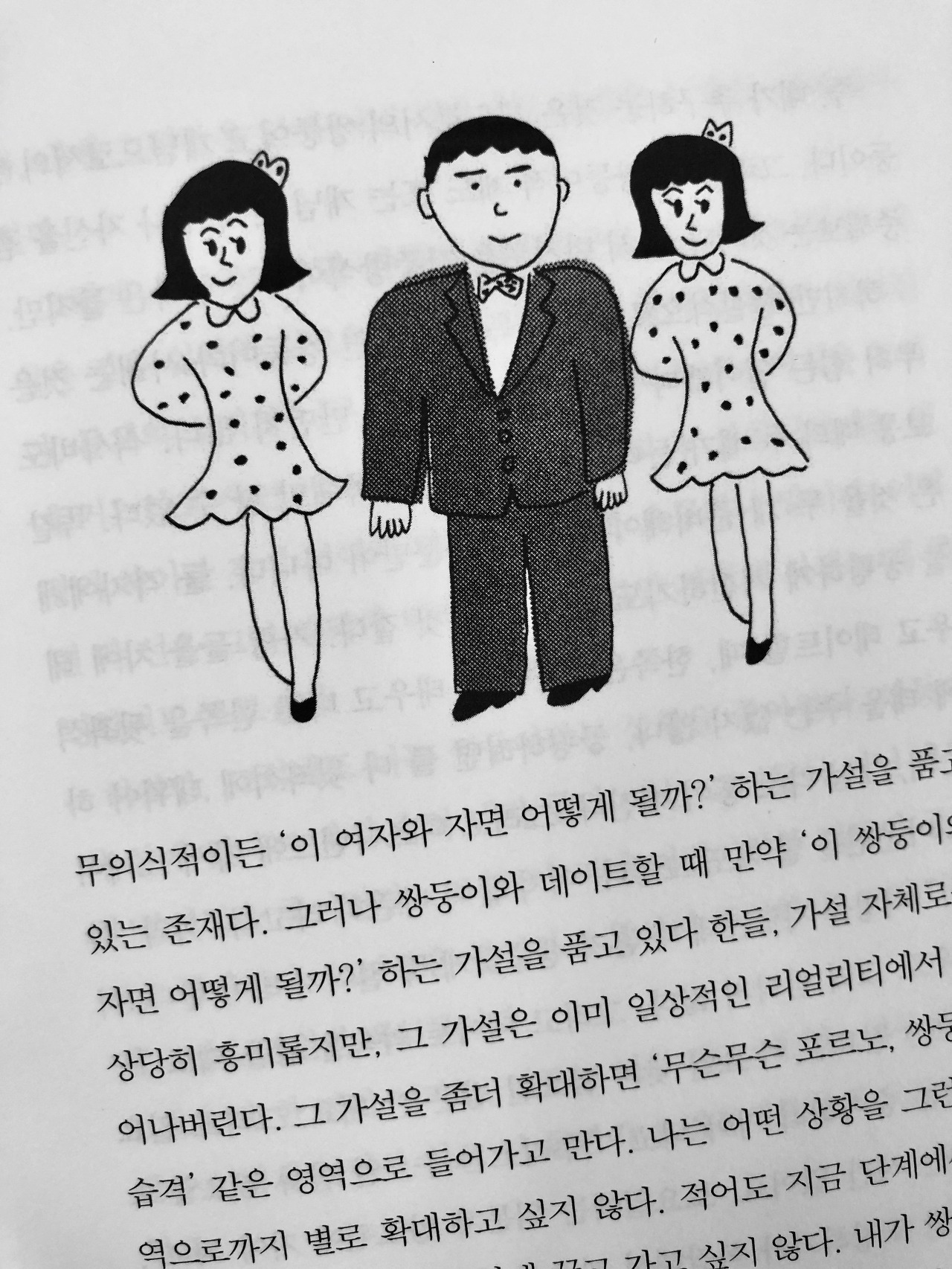
이번 수필집을 읽으면서 몇 가지 나에게 와닿는 일화가 눈에 띄었다. 그 중에 ‘청춘이라 불리는 심적 상황에 대하여’라는 글의 제목이었는데 그 글에서 하루키는 30대 초반에 이미 청춘이 끝났다고 느끼게 된다.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닮은 매력적인 젊은 여성에게 ‘제가 아는 여자분과 닮았어요’라는 말을 뱉음과 동시에 청춘의 끝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하루키는 그때의 심정을 ‘하나의 세계가 끝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 역시 몇 년 전에 그런 심정을 느꼈다. 거의 띠동갑이 차이나는 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시면서 거나하게 취했는데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이건 이렇게 하는게 좋아. 이렇게 하는게 미래를 대비해서 바람직해’ 식의 연설을 하는 나 자신을 느끼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나는 그때 하루키의 표현마냥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젊음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거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거나 하는 문구는 이미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아쉬움과 미련을 억지로 붙잡아두는 그야말로 ‘현실 부정’이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독려할 수 있는 ‘표어’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나이 40과 20대 초반의 교감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도 한창이고 젊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네가 듣기 싫어하는 회식자리 상사의 ‘꼰대연설’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내가 그랬으니,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 창피했다. 다소 혐오스러웠다. 그래서 요즘은 비슷한 연배와 횟수를 제한해서 동시대를 살며 느끼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젊은 시절, 넘치는 혈기에 과음을 하고 사회나 회사에 분노를 털어놓던 시절은 그 시절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난 시절이니 좋게 생각할 수 밖에.
또다른 수필은 ‘챈들러 방식’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소설가의 소설쓰는 비결에 하루키씨가 동감하는 이야기다. 이 방법은 하루 2시간은 무조건 책상에 앉아 종이와 연필을 쥐고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닫은 채 글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옮기거나 음악을 듣거나 해서도 안된다. 처음에는 글쓰는게 쉽지 않고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결말이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까지 ‘일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의 체력을 만드는 것 역시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실제로 나 역시 글이든 그림이든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다. ‘영감’이라는 것에서 목적물이 생성되거나 달성되지 않는다. 떠오르는 것을 기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까지의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다.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남는 시간을 붙잡지 않는 못된 습관 때문이라는 것을 최근에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먼저 시간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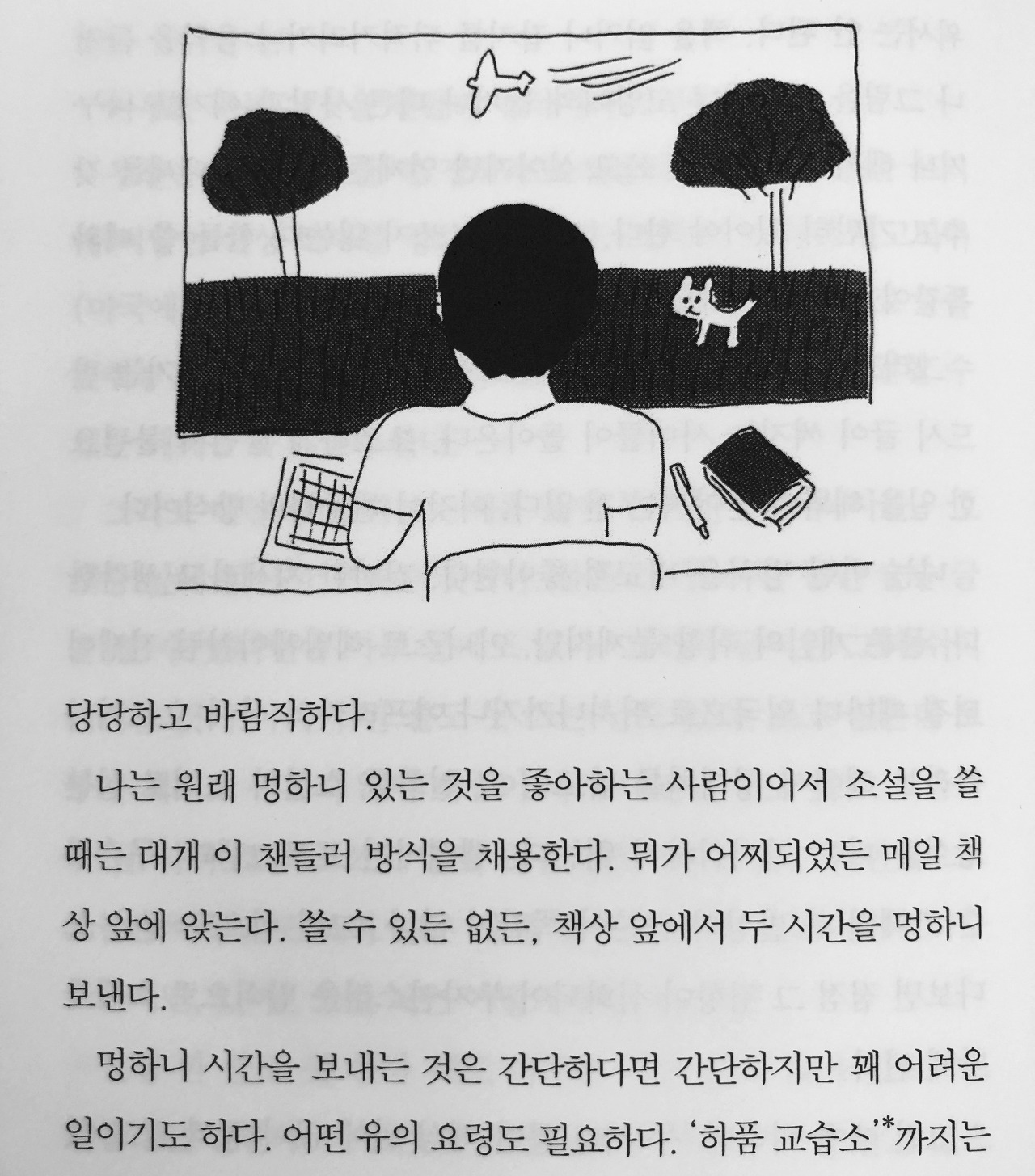
다른 여러 글도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일화들로 꾸며져 있는데 일본에서만 방영된 매체나 문화적인 부분은 가볍게 넘기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책이었다. 특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좀더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키우지 않았나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반드시 내 생각과 주장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근저에 기반하고 있으면 훨씬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리라 생각한다. 간혹 욱하는 성격에 상대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할 때도 분명 있는데 아내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성격만 고치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
자, 그럼 나도 맘속으로 뇌어보자 “그럴 수도 있지”.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자의 운 | 사이토 히토리 (0) | 2020.03.24 |
|---|
